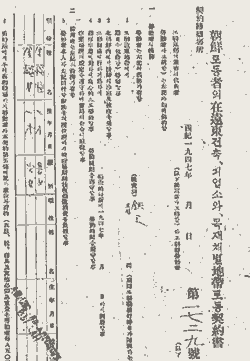
◇ 1947년 북한과 소련 사이에 체결된 소련 극동지역 산림채벌 계약서. 공식 명칭은 ‘조선로동자의 재원동건축, 기업소와 목재채벌지대 로동계약서’이다. 노동자들이 양심적으로 일하고 작업규정을 준수하며 당국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원동(극동)지역에서 건설, 임업, 어로 등의 노동을 시작한 것은 1940년대부터였다. 6.25때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됐는데 당시만 해도 자원자가 없어 죄수들이 동원됐다. 그러다 보니 절도, 폭력 등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러시아 정부의 항의로 70년대부터는 열성분자들을 벌목공으로 내보내기 시작했다. 여전히 자원자가 없어 당국에서는 거의 등을 떠밀다시피 강요해야 했다.
그러나 벌목공들이 돌아올 때 귀한 가전제품이나 식품을 갖고와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이때부터 벌목공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일단 러시아로 나간 벌목공들은 최선을 다해 돈벌이에 나서게 된다. 80년대 벌목공들은 현지 상품을 싹쓸이한다고 해서 "메뚜기떼"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것이 현지에서 사회문제가 되자 84년 소련을 방문한 김일성이 벌목공의 대우를 높여주고 임금을 루불화로 지불하는 조치를 취했다.

◇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노동자들이 휴식 시간에 숙소 앞에서 서성대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선일보DB사진
러시아 벌목은 이 무렵부터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는다. 100루불(당시 약 120달러 가치)이 넘는 월급을 받는 벌목공은 귀국때 생필품을 북한제 2.4t 트럭 하나 가득 실어오곤 했다. 일확천금의 기회로서 러시아에 가면 "이깔나무에 TV, 냉동기(냉장고), 녹음기 등이 주렁주렁 달렸다. 들어만 가면 돈번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즈음부터 뇌물이 벌목공으로 선발되는 기준이 되다시피 했다. 물론 탈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노동당원, 좋은 출신성분, 기혼자라는 3대 조건은 충족돼야 했다.
그러나 벌목공들은 계약기간 3년 동안 밀림의 벌목장에서 꼬박 감옥같은 홀아비 생활을 견뎌야 한다. 실상 들어간다고 해서 다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 열악한 생활조건과 최악의 작업환경에서 뇌물이 있어야만 임지를 할당받거나 부품을 공급받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번 돈을 북한에 송금할 때도 뇌물이 없으면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돈을 벌기는커녕 빚만 잔뜩 지는 경우도 있다.
80년대 말 소련이 붕괴되면서 인플레가 심해지고 기계나 부품 공급이 중단돼 돈벌이는 더욱 어려워졌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의 서민들 중에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벌목공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다. 벌목공으로 나가면 최소한 쌀밥 구경이라도 할 수 있으니 북한에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북한 벌목공의 수는 80년대 2만~3만명에 이르렀다가 지금은 5000명 이하로 줄었다고 한다. 벌목만으로는 돈을 벌기 어려워 이런저런 장사에 나서는가 하면 러시아인들의 집수리 등 잡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열렬히 자청한 노예생활이지만 아직도 원동의 북한 벌목공들은 서글픈 자신의 "운명"을 고쳐보려 묵묵히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다.
/김승철(40): 함흥수리대학 졸업, 러시아 벌목장에서 일하다 94년 탈북, 현재 북한연구소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