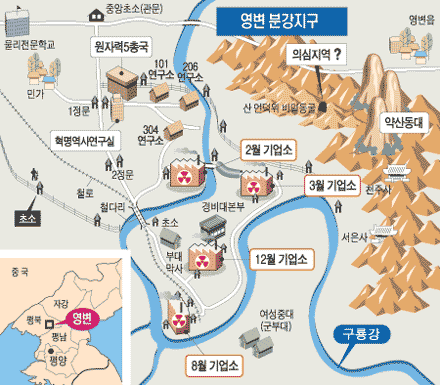
평북 영변의 분강(分江)지구는 북한의 핵개발 메카로 거대한 통제구역이다. 197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핵시설이 개발되면서 과학자들이 이주하기 시작했고 관련 시설 건설을 위해 해마다 수백명의 제대군인들이 집단 배치 됐다. 분강지구는 영변에서 독립돼 별도의 특별지구가 됐고, 4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들은 철저한 통제 속에 숨막히는 생활을 해 왔지만 94년 제네바 핵합의 이후 주민들의 생활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나 핵관련 기업에서 근무했던 김은숙(가명·26)씨는 『분강지구의 처녀들은 외지로 시집도 갈 수 없었고, 또 외부의 남자가 그곳의 처녀와 결혼할 경우는 남자가 분강지구로 들어와야 했다』고 말했다.
분강지구를 벗어나 읍 소재지에 가는 데에도 승인이 필요하다. 곳곳에 경비대 초소가 설치돼 있고 인민군 부대도 3개 여단이 주둔해 있다. 걸어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진달래로 유명한 약산동대도 군대 초소와 철조망 때문에 2시간 이상 돌아가야 한다.
친척에게 보내는 편지도 철저한 검열을 받아야 하고 여행은 여행증 뿐만 아니라 국가보위부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웬만한 여행은 대부분 거절된다고 한다.
김씨가 근무했던 ‘8월기업소’는 박천에서 들여온 우라늄을 가공해 핵연료를 추출하는 기초공정을 하는 곳이다. 이 기업소에만 10여 개의 직장에 모두 2000명이 근무했다고 한다. 근무자들은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분류돼 있으며 특급과 1급은 방사선 차단복을 입고 직접 핵시설에 들어가는 근무자들이고, 대개 여직원들은 3급으로 기계조정실 등에 근무한다고 한다. 김씨는 제네바 핵합의 이후 기업의 주요 공정은 멈춘 것 같지만 일반 업무는 계속됐으며 자신도 전과 같은 같은 일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가능한한 이곳 근무를 기피하는데 방사선 유출로 인한 피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외부에서는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폐인이 되고 기형아를 낳는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일은 철저한 비밀로 부쳐진 탓인지 실제 사례를 찾기는 힘들었다고 한다.
분강지구 주민들은 평양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이곳 주민들의 인사와 거주 결정은 원자력총국에서 관할한다. 모든 생활필수품이 평양에서 직송되기 때문에 식량난 이전에는 생활 형편이 좋았다. 하지만 경제난으로 간장, 된장, 기름을 제외한 공급이 중단되면서 살기가 매우 어려워 졌다. 다른 지역에선 장사라도 할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그것도 불가능해 더욱 어려움이 컸다고 한다.
94년 제네바 핵동결 합의 이후 핵사찰 등을 위해 국제기구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일체 외출이 금지됐고, 외국인이 직장 이름을 물어보면 「12월 기업소」 등으로 붙여져있는 이름 대신 핵관련시설 기업소임을 밝힐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핵 동결로 기업이 가동을 거의 멈추었는데도 근로자들의 이동은 허락되지 않았다. 하지만 간부들이 끊임없이 제의서를 올려 1차적으로 여성들의 외부인과의 결혼이 허락됐고, 이어특급과 1급 기술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은 원할 경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분강지구의 「2월기업소」는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고, 「3월기업소」는 핵 동결로 짓다 말았다고 김씨는 전했다.
분강지구 주민들은 대부분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다. 그러나 핵동결로 주요시설들의 가동이 중단되자 『우리가 결국 지고 말았다』고 그곳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고 한다./강철환기자 nkch@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