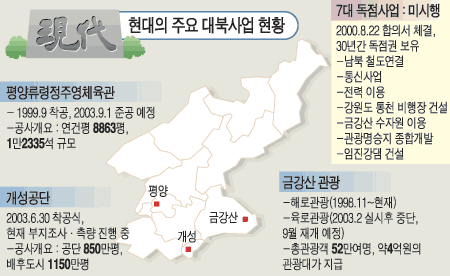
남북경협의 상징인 현대의 대북사업이 추진 5년여 만에 개척자와 계승자인 정주영(鄭周永) 명예회장과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회장을 모두 잃어 심각한 기로에 서게 됐다.
적자 투성이인 대북사업을 누군가가 대신 맡아서 정 회장 부자처럼 밀고 나가지 않고서는 중단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할 상황이다. 현대가 휘청거릴 경우, 다른 대북사업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
현대 대북사업의 2대 프로젝트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건설은 모두 현대아산이 맡고 있다. 현대아산은 이미 자본금이 잠식돼, 정 회장이 없는 상황에선 자립조차도 여의치 않다. 금강산 관광은 한국관광공사가, 개성공단에는 토지공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나, 모두 공기업이란 점에서 장래만을 내다보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북한이 5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조전(弔電)을 보내, “현대아산과 유가족들이 정몽헌 선생이 남긴 애국애족의 뜻을 변함없이 이어 갈 것으로 믿는다”고 해, 혹시 현대차의 대북사업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현대차는 대북사업에 뛰어들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 고위 관계자는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부문에만 전념할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은 정몽구 회장이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정몽헌 회장의 사망으로 인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삼성 등 다른 기업들은 정 회장이 맡았던 현대 계열사들을 돕겠다는 생각은 있으나, 대북사업에는 관심이 없다고 선을 분명하게 그었다.
남은 것은 정부뿐이다. 정부는 지난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216억원을 금강산 관광경비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작년 말 국회가 금년도 지원예산 200억원 중 199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도 ‘북핵 문제가 진전이 있을 경우 집행하라’는 단서를 붙여 놓았다.
또 정부가 직접 관광공사와 토지공사 등 공기업을 내세워 사업들을 떠맡을 수도 있으나 정부 스스로 정해놓은 ‘정경분리’ 원칙에 어긋난다. 현재로선 현대 사업들을 아예 이쯤에서 모두 접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남북경협의 원만한 지속을 위해 기존의 원칙을 뒤집고, ‘현대 살리기’에 나설 것인지만 남은 셈이다.
북한의 입장도 중요한 변수이다. 정 회장의 유언대로 김윤규(金潤圭) 현대아산 사장이 대북사업을 맡긴 하겠지만, 북측이 김 사장을 정 회장과 같은 수준으로 대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김 사장 혼자선 송호경·이종혁 등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의 면담도 쉽지 않았다. 자연 의사 결정이 지금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김인구 기자 ginko@chosun.com
/金熙燮기자 fireman@chosun.com

